
소설, 한국을 말하다
은행나무 출판
'소설 한국을 말하다'는 2023년~2024년 사이 문화일보에 연재됐던 한국 작가들의 4000자 안팎의 단편 소설을 엮어낸 책이다. 단 단편의 내용은 AI, 콘텐츠 과잉, 돈, 가족, 반려동물, 노동, 고물가, 번아웃 등등을 주제로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만한 소재로 쓰였다.

읽은 간단한 감상으로만 말하면, 소설의 시작은 2034년 시점에서 미래 출판사 배경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문장기술사로 비슷한 분위기는 한번 더 이어지더니 계속 이런 분위기인가? 싶었고, 그 탓에 계속 몰아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지점이 생겼다.
왜냐하면 독자 몇 번일 나는 아무리 지금이 AI 변화의 기점에 있어도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읽고 싶었기 때문이다.
제목이 한국을 말하다인데 너무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도 곤란하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른 단편들에서는 현실감 있는 이야기로 돌아와서 안쓰럽다가 공감했다가 다시 실소하며 피식할 이야기로 끝났다. 그리고 책을 덮었을 때는 실제 연재순인지 모르겠지만 왜 시작과 끝이 그랬는지 내 마음대로의 추측으로 알 것 같은 기분이었다.

소설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이 여러 모습으로 등장해 현실감 있게 그려진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어떤지 알고 싶다면 충분히 공감하며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거짓된 이야기더라도 현실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소 무겁게 읽힐 수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안쓰럽게 읽힌 면도 있었다.
그렇지만 처음과 끝 무렵에서 읽을 수 있었던 '소설 2034'와 '그분의 목숨을 구하다'는 그와는 달리 상반된 분위기를 띠어 '그래, 이게 한국이지!' 싶어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덮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됐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제 42회 문장 생성사 자격면허 시험, 상자를 열지 마세요, 남겨진 것, 금요일, 우리들의 방, 낙인 등도 좋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단편도 그들이었다.
그런데 이건 아마 처음과 거의 끝에 배치된 이야기여서 그랬을 가능성도 크다.
원래 시작과 끝만 기억되고 중간은 잊힐 가능성이 큰 법이니까.

“난 성공을 찬미하는 게 K-정신이라고 생각해. 여기서는 성공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야.”
"현실을 보면, 글이 꼭 참신하고 좋아야만 할 필요는 없다.
그저, 출판사나 언론 업계의 높은 분들의 눈에 참신한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글이 아니라, 내 글을 받아보고 평가하는 출판사, 언론사, 방송사의 어느 높은 분이 읽었을 때 '이 글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거 같다'라고 지레짐작 할만 느낌을 주는 글을 쓰는 게 정말로 먹고사는 데에는 훨씬 유리하다."
“요즘 내 강연을 들으면, ‘그분’은 완전 갓이야 갓.
한국 사람들이 재벌 싫어하고 욕한다고? 절대 아니야. 사람들 재벌 찬양 썰 듣는 걸 훨~씬 더 좋아해.”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그런 이야기에 공감하고 한국을 비웃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그게 또 한국의 재미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실제로는 어떤 일을 겪거나 그 현실을 사는 당사자에게는 잔인한 면이 있는 게 한국사회이기도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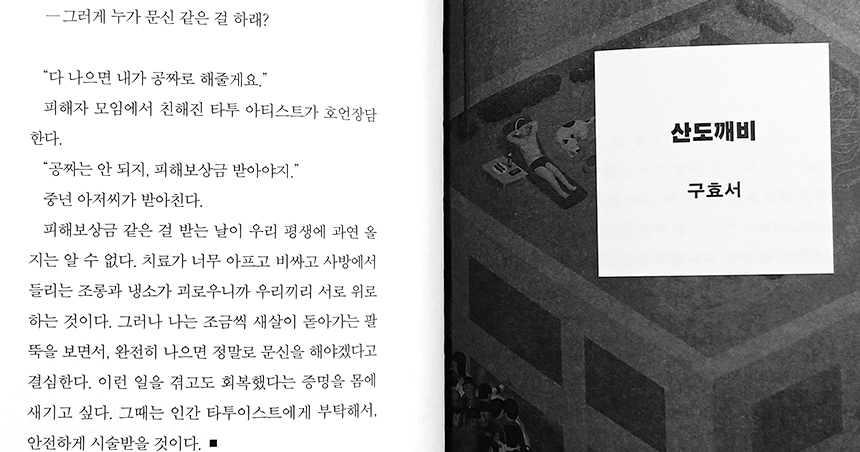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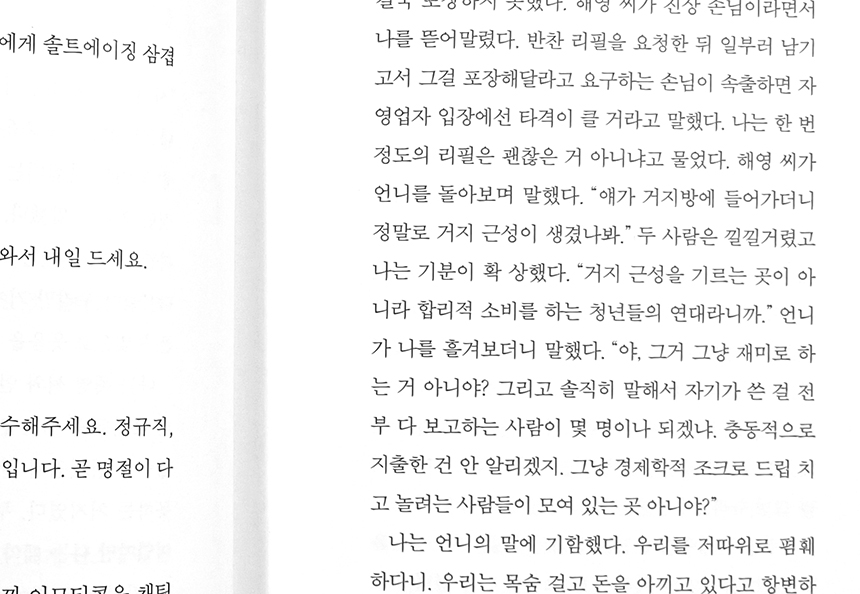
-그러게 누가 문신 같은 걸 하래?
그러나 나는 조금씩 새살이 돋아가는 팔뚝을 보면서, 완전히 나으면 정말로 문신을 해야겠다고 결심한다.
이런 일을 겪고도 회복했다는 증명을 몸에 새기고 싶다.
언니가 나를 나무라듯이 말했다. “우산 사줄 테니까 쓰고 가.” 나는 극구 만류했다.
그러니 그럴수록 스스로를 가엽게 여기지 말고 이 사회에, 이 현실에 쓴 웃음을 지은 채 비웃어줘야지.
꿋꿋이 살아내서 증명해내야지.
아, 그게 그래서 그런 마음이라서 기억에 남은 걸까.
그래도 우산은 써야지. 사준다고 할 때 냉큼 받아야지. 그리고 알고 보면 '거지방'의 그 언니도 좋은 사람이었어.
아, 속물인 걸까.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다 양면성이 있는 법이다.
단어만 바꿔 부른다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스스로 정의하는 대로 되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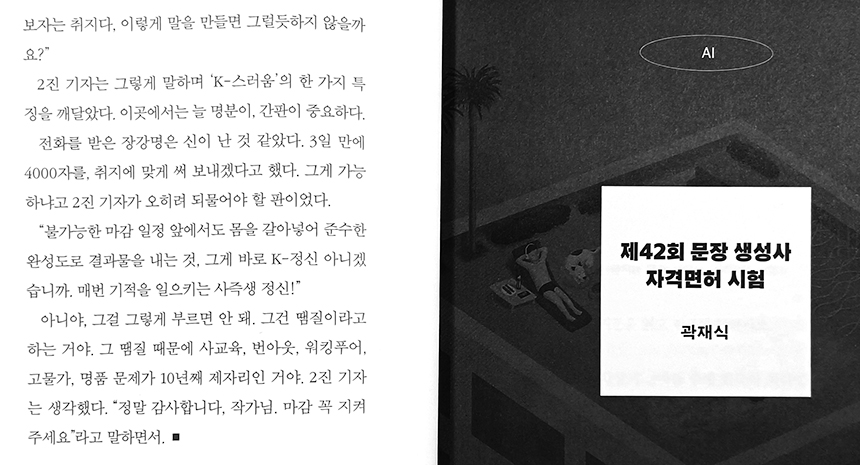
“시대정신이라. 이제 그 단어 자체가 의미를 잃은 거 아닐까?
다 같이 관심 갖는 사안,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이슈라는 게 있긴 하나?
사회가 다 파편화돼서 공통 감각이라는 게 없어진 시대잖아.
지금 어떤 문제 제기가 모든 한국인한테 시의적절할 수 있는 거야?”
어쨌거나 소설에서도 이야기했던 파편화된 사회.
평소 여기기에도 요즘은 특히 더 파편화돼서 지금의 한국 사람들을 아우르는 무언가 있을까 싶었는데, 여러 단편들마다 일정부분 다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현시대에 내가 흡수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가 보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궁금하다면, 또 내 이웃일 수도 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읽어보길 권한다.
한편으로 이 사회는 왜 그럴까 생각해봤을 때 그것은 착취의 구조라서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소설은 적어도 적당한 현실감과 무게감도 있고 덤덤한 듯 유쾌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이 아이는 다르지만 '서로 의지해 사는 일에 대해서라면' 그 의미라면 정말 얘기가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
결국 같이 살아가야 하는 건 '그 '돈' 아이'가 아닌, 생명들이니까.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0) | 2024.12.31 |
|---|---|
| 인성에 비해 잘 풀린 사람 (0) | 2024.12.10 |
| 노력의 배신 (0) | 2024.11.23 |
| 시대예보 : 호명사회 (0) | 2024.1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