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성에 비해 잘 풀린 사람
남궁인, 손원평, 이정연, 임현석, 정아은, 천현우, 최유안, 한은형
문학동네 출판
일전에 읽은 책에서 이 소설의 제목을 봤다.
'인성에 비해 잘 풀린 사람'이라니.
호기심이 일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표지의 그림을 보라. 이렇게 눈에 들어온 이상 당연히 읽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읽었다.

그래서인지 여러 단편이 실려있었지만 인성에 비해 잘 풀린 사람이 가장 좋았고, 식물성 관상, 피아노 등이 기억에 많이 남았다. 하지만 끝내 왜 인성에 비해 잘 풀린 사람인지는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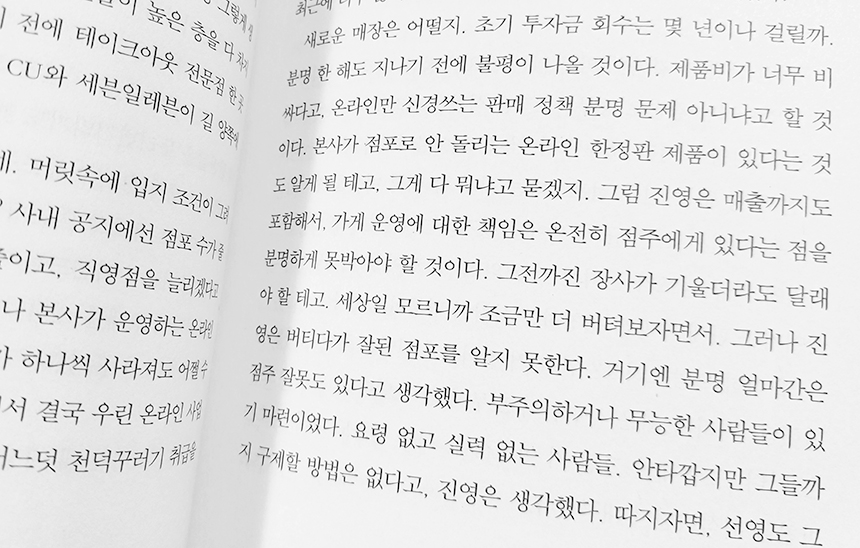
인성에 비해 잘 풀린 사람의 주인공 진영은 영업직 관리자다.
목차에서 볼 수 있는 이 단편의 태그가 '#프랜차이즈 #본사 vs 점주 #인성 vs 수완 #조직 생활'인 만큼 진영이 본사의 영업관리직으로 일하면서 가맹 점포와 점주를 어떻게 요령 있게 대하고 조직생활을 해나가는지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진영의 심리를 읽다 보면 기저에서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진영은 영업관리자로서 가맹점주를 내려다보고 있다.
아니 내려다보고 있다가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껴졌다.
그래서 오만하다면 오만하고, 요령이라면 요령이고, 공감이라면 공감인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이 단편 소설의 제목이 왜 '인성에 비해 잘 풀린 사람'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듯했다.
그러나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진영의 인성을 말한 건 아닐 것이다.

어쨌든 소설에는,
"사라지는 가게들을 최근에 너무 많이 봐왔다."
"어쩌자고 이런 데 매장을 차렸을까. 입지가 반인데. 아니, 전분데. 그는 그 매장에 갈 때마다 생각했다."
"요령 없고 실력 없는 사람들. 안타깝지만 그들까지 구제할 방법은 없다고, 진영은 생각했다."
"가끔씩은 아무 조언이든 경고든 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처럼 굴어. 때론 장사든 세상이든 다 아는 것처럼.
역시 순오가 알려준 관리법이었다."
"진영은 점차 사회생활에선 무능해서 비웃음을 사느니, 약간은 비열한 게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됐다."
"잘 버텨야죠, 뭐."
"진영은 생각했다. 더 나은 위안과 응원을 건넸어야 했던 게 아니었을까."
같은 주인공의 심리가 이어지다 진영이 관리하는 가맹점포 점주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다.
"장사는 처음예요?"
진영은 무심히 물었다.
"처음이죠. 여성복 디자이너였어요. 서울에 있는 골프복 회사에서 여성용 니트 했거든요."
"그렇군요."
소설에서 결말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중요한 대화도 아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게 진영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장사에 대해서, 가게 주인에 대해서, 가맹점이든, 점포든, 매장이든, 자영업자이든, 사장님이든,
우리는 지금 현재 보는 그 사람이 그 이전에는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그저 지금 내 눈앞의 가게 주인일 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은퇴 후에 떠밀리듯이 장사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를 떠올렸을 때 진영 또한 회사를 떠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영과 가맹점주였던 선영의 입장이 바뀌면 진영도 먼 훗날 그런 인성과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 사람을 마주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됐다.
그리고 한편에선 손님 입장으로는 반성도 하게 됐다.
왜냐하면 나도 사라지는 가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으니까.
저 자리는 장사가 안 될 텐데... 결국 문을 닫았네, 임대 붙여놓은 가게는 문 닫으면 뭐 먹고살까 등등.
물론 그건 안타까운 마음에서 든 생각이지만 거기에는 다른 이를 내려다보는 듯한 마음도 섞여 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무심코 있었다가 없어진 것들을 생각하니 그런 공간은 혼자만의 것이 아닌,
유기적인 형태의 무엇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여하튼 사회생활 요령, 믿음, 인성 등.
결국 사람을 믿는다는 건 뭔지, 어디까지가 믿으면 순진한 거고, 어디까지가 믿지 않으면 영리한 건지.
그 모든 것이 뒤엉켜 혼잡한 이미지만 떠오른 좋았던 '인성에 비해 잘 풀린 사람'이었다.
그 외는 식물성 관상의 보이사. 묘하게 인상적이라서 현실에 그런 장소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생생한 캐릭터로 기억에 많이 남았다. 정말 이 작품은 마치 한 편의 영화와 캐릭터처럼 느껴지는 분위기가 다했다.
피아노의 '함몰'의 의미도 좋았다. 그런 게 어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건지는 몰랐다.
그리고 결의문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조지 오웰이 떠올랐는 점에서 기획의 말을 대신하여도 좋았다.
"나는 저 현상들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그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고통에 대해서는 쓸 수 있다.
후대 작가들은 알 수 없는 것, 동시대 작가의 눈에만 보이는 것도 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뭔지 잘 모르지만 작가들이 언어로, 글로, 문장으로 써주니 선명히 알게 되는 것 같은 느낌.
이 소설에 담긴 모든 이야기들에게는 다 그런 힘이 다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좋았다.
결국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너가 말하고 싶은 게, 너가 느낀 게 이런 거였어 하고 미처 깨닫지 못한 마음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게 문학의 힘이 아닐까 싶다.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쓰고 싶다 쓰고 싶지 않다 (0) | 2025.01.10 |
|---|---|
|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0) | 2024.12.31 |
| 소설, 한국을 말하다 (0) | 2024.11.30 |
| 노력의 배신 (0) | 2024.1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