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의 하루, 에벨리너 크로너
에코리브르 출판
Een dag in ons brein: Begrijp je hersenen en die van de mensen om je heen
뇌의 하루는 네덜란드의 발달신경과학자 겸 뇌과학자가 쓴 뇌에 관한 책이다.
하루 동안 뇌에서 벌어지는 일과 사람들의 예를 통해 뇌에 대한 궁금증에 답한다.
이 책에서는 한 거리에 사는 이웃들의 하루를 따라가며 그들의 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들여다본다. 삶의 단계도 모습도 다양한 이들은 때론 슬퍼하고 때론 기뻐하며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을 보내는 듯하지만 이들의 뇌에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신호를 전하는지, 어떤 영역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감정과 행동을 바꾸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하루가 새롭게 보인다.
그래서 쉽게 쓰인 책으로 보다 뇌에 관해 이해하기에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그림을 좋아해서 책에서 볼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이 가장 마음에 든 책이기도 했다.

특히 뇌의 우뇌와 좌뇌를 그와 같이 표현한 그림은 처음 봐서 너무 인상적으로 와 닿은 책이었다.
그게 궁금해서 검색해봤더니 아마도 일러스트레이션은 캐롤라인 더 콕(Caroline De Cock)이라는 작가가 그린 것 같다.
하지만 국내에 출판되면 변경되기도 하니까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린 작가가 정확히 책에 표기되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다.
덧붙여 종이책에서는 볼 수 있는지 몰라도 삽화 일러스트레이터까지는 안 적혀 있는 책이 많아서 늘 아쉽다.
독자는 글이 중요하므로 그런 부분은 궁금해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여기는 탓일까.
아니면 이런 것을 더 궁금해하는 내가 소수의 독자에 드는 탓일까.
어쨌든 뇌에 관해 궁금하고 일러스트를 좋아한다면 꼭 책에서 살펴보길 바라며...
여하튼 책은 쉽고 재미있어서 좋았다.
그러나 글은 계속 사람의 하루, 뇌 설명, 연구와 실험, 뇌 상식, 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 뚜렷이 기억나는 내용이 없는 것도 같다.
다만 쉽게 쓰인만큼 전전두피질, 엽, 시냅스 등등의 전반적인 뇌 구조와 기능에 관한 설명은 분명히 좋았고, 저자가 발달심리학자의 이력을 지닌 탓인지 청소년기의 뇌에 관해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특히 청소년기의 반항심과 어른의 순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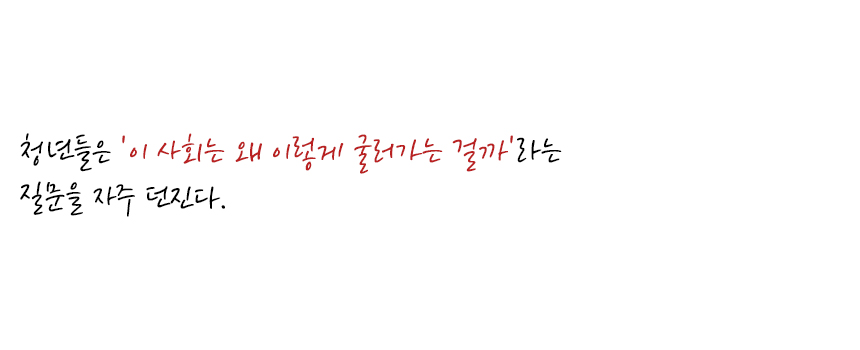
청년들은 '이 사회는 왜 이렇게 굴러가는 걸까'라는 질문을 자주 던진다.
청년기에는 사회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크다.
실험 참가자들은 화면 속 가상의 풍선을 하나씩 불었고, 그때마다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풍선은 너무 많이 불면 터져버리고, 그동안 번 돈은 전부 사라진다.
실험 결과는 명확했다. 아이나 성인들은 대부분 일정한 횟수까지만 풍선을 불고 멈췄다. 일정한 수익을 얻으면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익을 챙기는 쪽을 선택했다.
하지만 십대들은 달랐다. 이들은 풍선이 팽창해 터지기 직전까지 멈추지 않았고 풍선이 터지는 경우도 더 많았다.
실험은 위험 감수 행동이 18∼20세에 가장 많고 이후에는 점점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비단 인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동물들도 사춘기에 접어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사춘기에 들어선 쥐는 안전한 집을 떠나 바깥세상을 탐험하려 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평등을 싫어한다. 그런데 현실 세계는 불평등으로 가득하다.
왜 우리는 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걸까?
연구에 따르면 어린아이들은 평등의 규범을 매우 엄격하게 따진다. 사탕이나 장난감을 동등하게 나누지 않으면 즉각 분노한다. 이는 동생이 건포도 하나를 더 받았다고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절대적 평등의 개념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조건부 허용'으로 점차 바뀐다.

성인이 되면 많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을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권한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간다거나, 내가 더 열심히 노력했으니 더 많이 가져갈 자격이 있다고 여긴다. 실험실같이 상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통제된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상대의 노력, 공평성, 특권에 대한 가정을 빠르게 세우고 여기에 따라 판단을 내린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해 과도한 긍정적 기대를 품을 수도, 반대로 부정적 전망에 빠질 수도 있지만 긍정적 편향이 더 자주 나타난다. 전 세계적으로 18∼22세의 청년들이 위험 감수 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관주의가 그 배경이 되는 셈이다.
청년은 혼자 성장할 수 없다. 자신의 안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더라도 사회적 구조의 지지 없이는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기 어렵다. 사회가 청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줘야 청년도 사회를 위한 역할을 온전히 해낼 수 있다.
이를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청년뿐 아니라 요즘은 그 누구나 쉽게 하는 자가진단.
그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염려한다.
어느 쪽이든 정신 질환에 대한 낙인이 깨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심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가 진단'이 남발되는 현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발달심리학자 루시 포크스는 이 점에 대해 경고한다.
우리는 일상적 대화에서 "나 오늘 좀 우울해"라고 쉽게 말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기분이 살짝 가라앉은 상태일 수 있다.
또한 "요즘 젊은 세대는 다들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식의 서사가 반복되면 결국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꾸 그렇게 말하다 보면 젊은이들 스스로도 그렇게 믿게 되어 정말로 더 우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말을 되풀이하면 현실이 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가 진단에 빠져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거나 자신을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부정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쪽으로서 다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과도한 낙관주의 또는 어른의 무조건적인 순응.
그것도 아니면 사회의 꼴.
다 탐탁지 않으니 그저 뇌의 관점에서 보면 뇌가 그런 거라서 인간도 발달 과정에 따라 그런 감정과 변화를 겪는 따름인 건지, 뇌를 변화시키는 것은 생물학적인 요인인지, 사회의 요인이 더 큰 건지.
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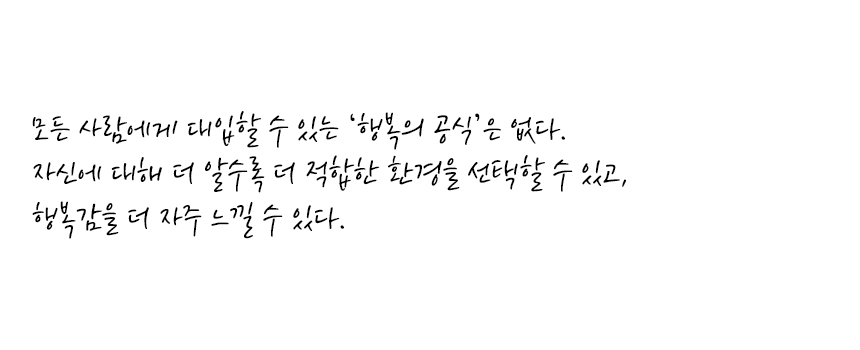
그러고 보면 뜬금없는 말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이성적인 뇌도, 감정적인 뇌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이 책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건 좋은 일러스트와 글을 볼 수 있어서 그때마나 내 뇌(?)는 행복하고 좋아했었다는 점.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뇌에 관심이 있다면 추천해볼 수 있을 만한 책이 아니었나 한다.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걷는다 (0) | 2026.01.01 |
|---|---|
| 원씽 (0) | 2025.12.24 |
| JOBS - NOVELIST (잡스4: 소설가) (0) | 2025.11.21 |
| 평가받으며 사는 것의 의미 (0) | 2025.1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