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지구에 돈 벌러 오지 않았다, 이영광
이불 출판
시인의 산문집이다. 나는 지구에 돈 벌러 오지 않았다는 제목부터 눈길을 끌기도 하고 그 제목에 관해 한 두 번 들어본 적은 있었는데 마침 일전에 읽은 책에도 소개되어 있어서 읽게 되었다. 무엇보다 '나는 지구에 돈 벌러 오지 않았다'의 맥락이 알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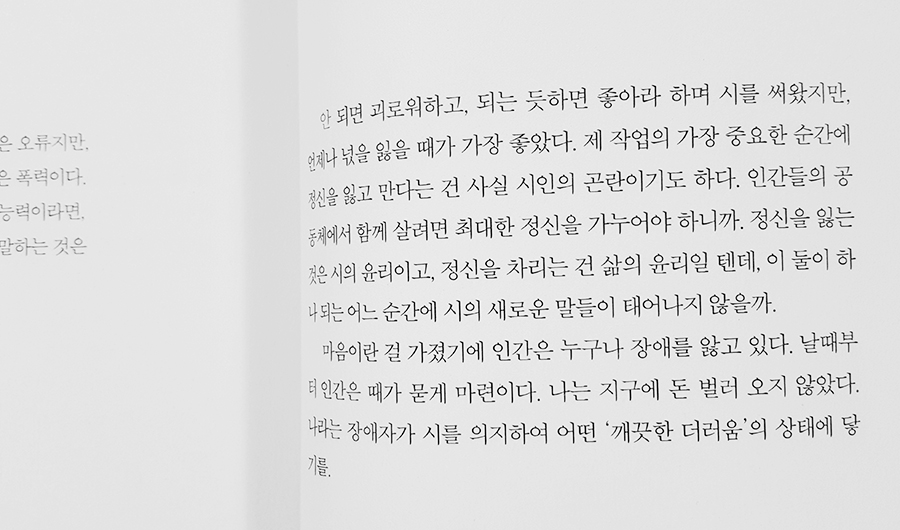
그리고 읽기 전 책에 관해 대강 찾아보다 눈에 들어온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의 맥락도 궁금했다.

"바닥을 만나야 내 바닥이 나타난다. 황폐한 것, 막막한 것이 인간을 수렁에서 건져준다."
글은 시인의 산문집답게 시에 관한 글과 사회 등 여러 내용이 있었는데 나는 긴 글보다는 짧은 한 두 문장에서 엿볼 수 있는 시인만의 글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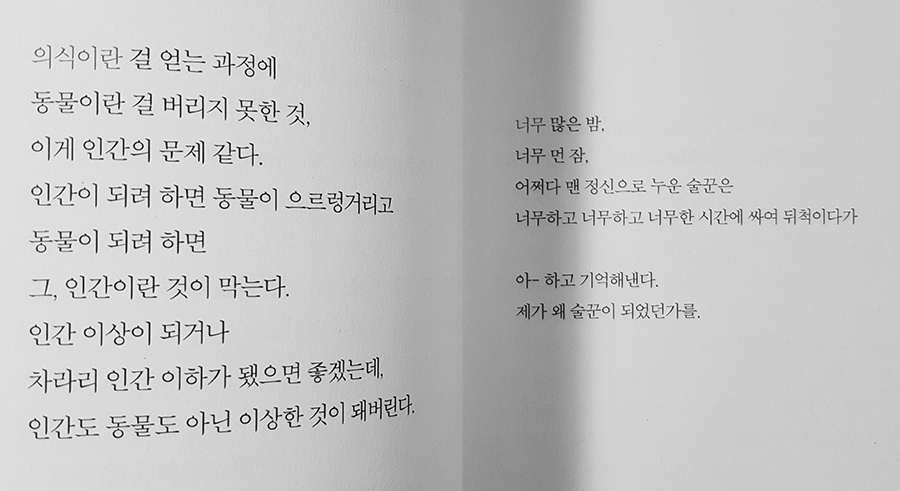
의식이라는 걸 얻는 과정에 동물이란 걸 버리지 못한 것, 이게 인간의 문제 같다.
인간이 되려 하면 동물이 으르렁거리고 동물이 되려 하면 그, 인간이란 것이 막는다.
인간 이상이 되거나 차라리 인간 이하가 됐으면 좋겠는데, 인간도 동물도 아닌 이상한 것이 돼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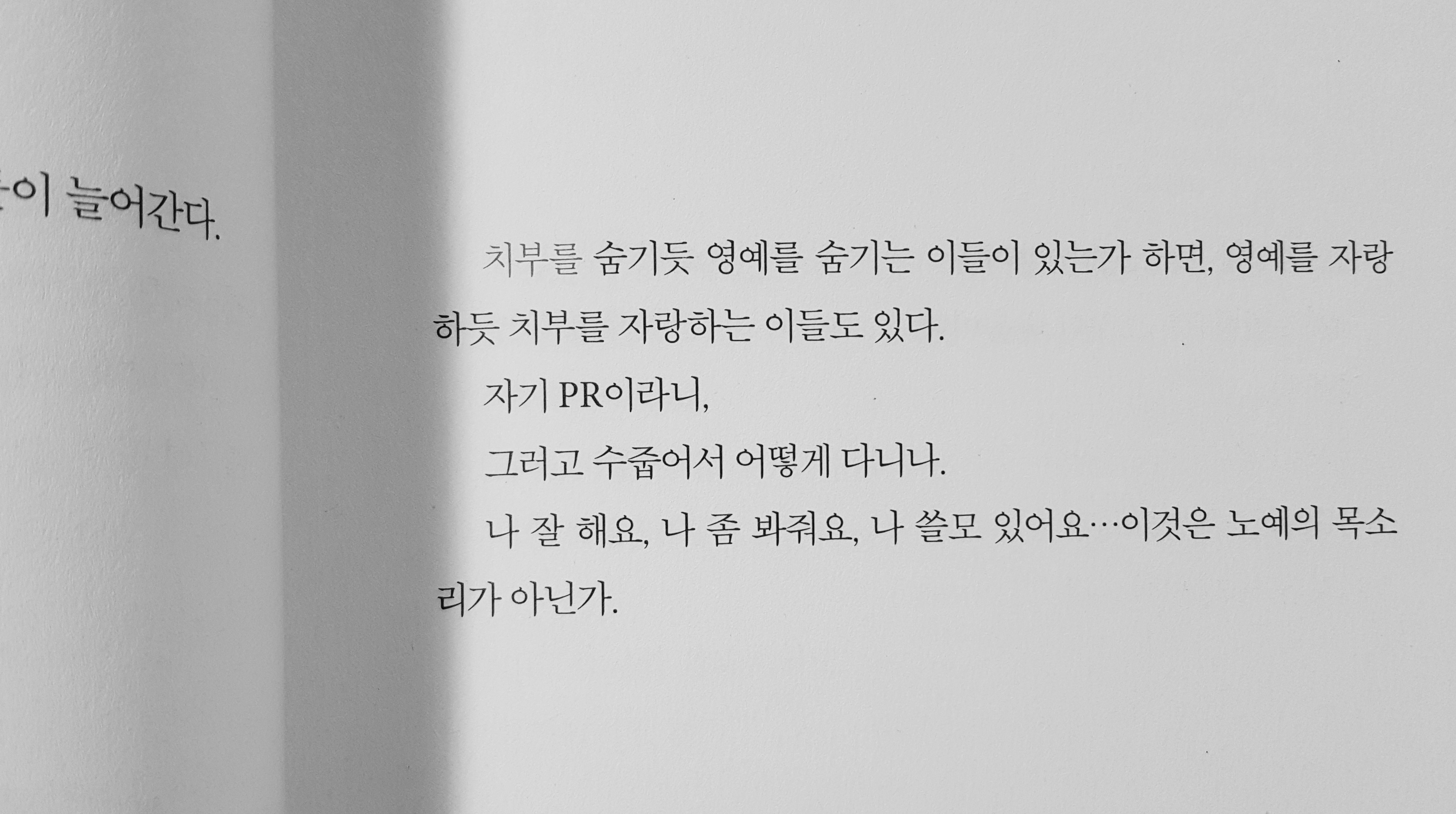
자기 PR이라니, 그러고 수줍어서 어떻게 다니나.
나 잘 해요, 나 좀 봐줘요, 나 쓸모 있어요... 이것은 노예의 목소리가 아닌가.
자기를 알아달라고 아우성 하는 게 본래 인간이지만, 남이 자기 안 알아준다고 안달인 사람들은 대개 남을 잘 안 알아주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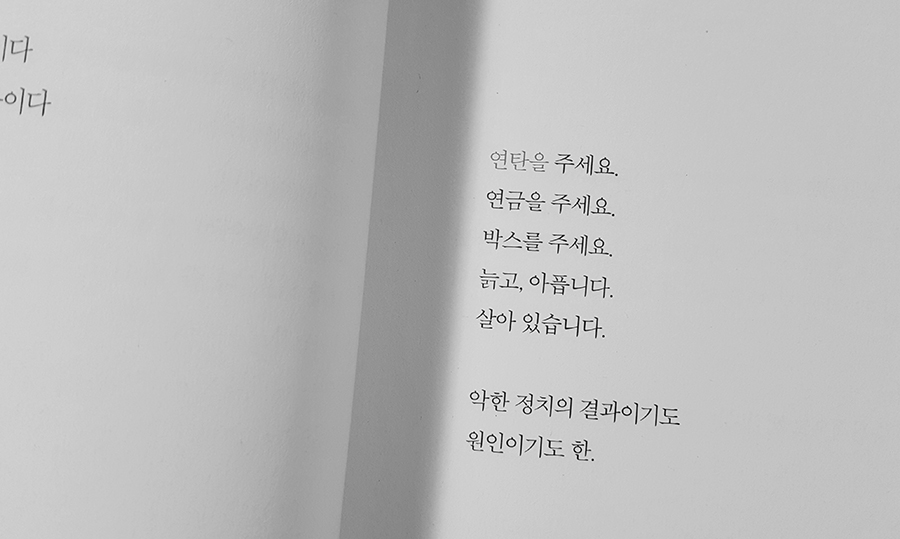
연탄을 주세요.
연금을 주세요.
박스를 주세요.
늙고, 아픕니다.
살아 있습니다.
악한 정치의 결과이기도
원인이기도 한.
죄 짓고도 떳떳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지은 죄 없이 초라한 이들도 있다.
나는 갑질을 안 하나? 그럴 리가?
어디에도 을이 있다.
약한 자는 눈알이 벌게져서 더 약한 자를 찾아다닌다.
싫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좋지 않다는 게 문제다.
'싫지 않은 것'은 참아야 하고, '좋지 않은 것'은 참을 수 없다. 좋아야 한다.
살다 보니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사람 얼굴을 보게 됐지만, 사실은 사람을 본 것도 아니고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얼굴의 표정들을 봐 왔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의문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다. 대답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만나는 건 끔찍하다.
더구나 단 하나의 대답을 가진 경우엔.

모든 헤멤과 질주를, 인간의 경영을 종국엔 허무로 바꿔버리는 인생이라는 것보다 더 큰 과장이 애초에 있을까.

누군가 나에게 말했다.
그런 자세는 건강에 안 좋다.
그런 음식은 건강에 안 좋다.
그런 생각은 건강에 안 좋다.
그런 슬픔은 건강에 안 좋다.
... 건강은 나에게 많이 안 좋다.
젊어봤으므로 늙을 수 있는 것이다.
죽음을 꺼내 가면 모든 게 그만인데도 목숨은 너무 들떠 있고 너무 태연하지 않나.
'언제'만 모르면서 목숨은, 꼼지락거린다.
나도 내가 대충 살고 말리라는 걸 안다. 노후를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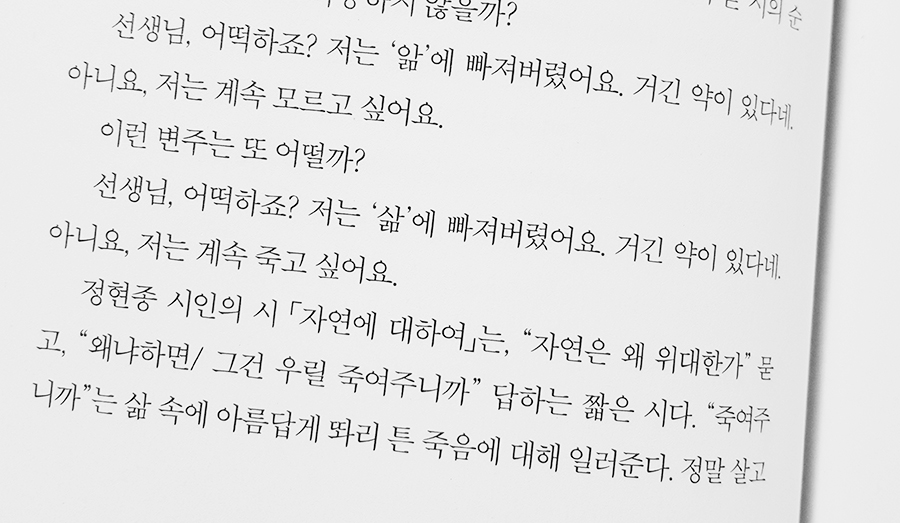
"자연은 왜 위대한가."
"왜냐하면 그건 우릴 죽여주니까."
시는 삶보다 작다. 하지만 시가 삶에 육박하거나 홀연 그것을 능가하는 듯한 순간이 있다.
이 이상한 도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는 쓰기 어렵다.
어둠은 눈을 감은 빛이요, 빛은 눈을 뜬 어둠이리라.
얼핏 제목만 보면 자조적으로 '그래도 돈 벌러 지구에 안 왔으면 뭐라도 하러 왔겠지...' 또는 도발적으로 '돈 안 벌면 뭐할 건데?'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읽으면서는 종국엔 모든 사람은 '병들어' 죽는다는 것이 더 다가오기도 했다.
또는 그 비판과 분노 어린 글을 보며 인용되었던 셰익스피어의 글처럼 "분노를 누르고, 당신의 칼을 도로 칼집에 넣는 용기를 보여주세요"라고 말하고픈 책이기도 했다. 어쩌면 그 마음들에 공감하지만 사는 것만큼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물론 이 책은 죽음에 관해 말하는 슬픈 책이거나 분노하는 책은 아니지만 말랑말랑하고 다정한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 읽기에는 마냥 좋다고 안 여겨질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우연히 본 제목이나 글의 맥락이 궁금해서 읽은 책인데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시인이 적었던 글처럼 '시가 삶에 육박하거나 홀연 그것을 능가하는 듯한 순간'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으로서 '종국엔 그 모든 것을 허무로 바꿔버리는 인생'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정말 사람은 왜 지구에 왔을까. 나는 또 왜 여기 있는 걸까.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더 시스템 (0) | 2022.09.17 |
|---|---|
| 100만 클릭을 부르는 글쓰기 (0) | 2022.09.10 |
| 별게 다 영감 (0) | 2022.09.03 |
| 과식하지 않는 삶 (0) | 2022.08.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