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의 神, 우노 다카시
쌤앤파커스 출판
トマトが切れれば,メシ屋はできる 栓が拔ければ,飮み屋ができる
일본 요식업계에서 성공한 우노 다카시가 장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우노 다카시가 길러낸 선술집 사장도 20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책의 내용도 그들에게 일러주듯 친근하고 다정하게 쓰여져 있어서 좋았다.
무엇보다 저자의 글에서 엿볼 수 있었던 손님을 생각하고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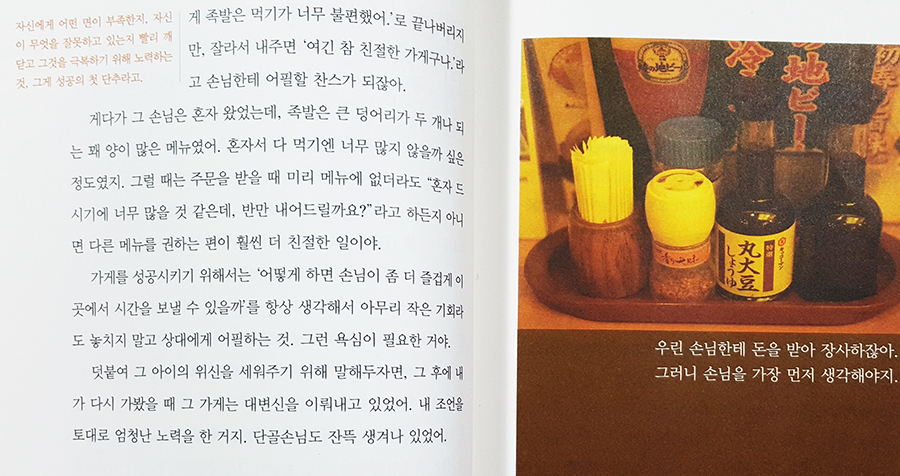
우린 손님한테 돈을 받아 장사하잖아.
그러니 손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지.
어릴 적 어머니를 생각해봐. 어머니가 만든 요리를 자녀가 잘 먹지 않는다면 당연히 '왜 안 먹지?'라고 생각하겠지.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그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야 해. 그러니 테이블에 남은 요리를 보고 '어째서?'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음식 장사는 그만두는 편이 좋아.
흔히 '손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라'고들 하잖아. 하지만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잘 모르는 거야. '손님'이 아니라 '나'여야지. 어떤 가게라면 즐거울까? 그걸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가게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긍정적이고 이미지화시키는 능력이 강한 사람은 손님이 비에 젖은 채 가게에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타월을 건넨 뒤에 손님이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하며 함께 미소 짓는 모습까지 상상할 수 있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점장이나 경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접객이란 한마디로 '상대를 즐겁게 만드는' 일이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접객은 테크닉이 아니야. 상대가 얼마나 기뻐할지, 그걸 생각하고 있느냐가 관건인 거지.
장사라는 건 김 모 씨나 최 모 씨처럼 구체적인 손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아, 이 사람한테 이걸 먹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즐겁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
즐긴다는 것.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자신의 일을 즐기고, 그 가게에 온 손님도 식사하는 그 시간을 즐기게 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장사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예로서도 장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책이기도 했다.

메뉴에 그냥 '어묵'이라고 쓰면 심심하지만 '참 신기하죠. 여름인데도 인기 있는 어묵' 이렇게 메뉴에 쓰는 거야. 장난스러우면서도 재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라?'하며 관심을 가져줘.
회를 내려고 새끼 방어 횟감을 사온 적이 있었어. 그런데 기술이 없으니 깔끔하게 썰어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아예 '대충 썰어 더 맛있는 회'라고 이름을 붙여 메뉴를 만들었어. 단면이 엉망진창이라도 신경 쓰지 않게끔 대접에 담아낸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이걸 엄청 좋아하는 거야.
"가위 좀 줄래요?"
이럴 때는 "아, 먹기가 많이 불편하신가요? 여기서 잘라 드릴게요"라고 말하고 잘라서 내줘야 해. 가위를 빌려주기만 한다면 '이 가게 족발은 먹기가 너무 불편했어'로 끝나버리지만, 잘라서 내주면 '여긴 참 친절한 가게구나'라고 손님한테 어필할 찬스가 되잖아.

어쨌든 나는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의외로 재미있게 읽혀서 좋았던 책이었고, 그 내용도 요식업을 준비하거나 장사 중인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읽어봐도 좋을 책으로 보였다.
게다가 이 책이 좋았던 점은 손님으로서도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 점을 짚어준 것이었다.
특히 '한 번 온 손님은 다시 오게 만들자.'
피자든 라면이든 맥주든... 먹고 마시려는 사람은 넘쳐 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입던 옷 대충 걸치고 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다 요리도 웬만큼 하는 가게가 있다면 손님 입장에선 그보다 좋을 순 없지 않겠어?
무조건 싼 메뉴를 팔 생각만 해선 안 돼. 손님이라고 싼 데만 눈이 가는 게 아니니까.
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시기라도 손님들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윤택한 기분을 맛보고 싶어 해.
싼 걸로 승부하게 되면 라이벌은 편의점 어묵이나 맥주가 되는 거야.
가게에서 마시는 것보다 집에서 마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버리지.
집 근처 대형 슈퍼 맨 위층에 있는 돈가스 체인점도 굉장해. 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니던 곳인데 느낌이 좋은 아주머니가 일하는 곳이지. 그녀는 항상 손님을 자주 살피면서 "어머, 양배추가 없네. 더 줄까?"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물어봐. 마치 엄마가 물어보는 것처럼 말이야. 참 따뜻하지. 된장국도 얼마든지 그냥 줘. 그런데 하루는 그 체인의 다른 지점에 가게 됐는데, 된장국을 더 달라고 했더니 주인장이 무뚝뚝한 태도로 와서 "추가 요금 있어요"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직 어린 딸아이가 하는 말이 "여기는 만날 가던 데랑 맛이 달라, 아빠!"
똑같은 체인인데 그렇게 다를 리가 있겠어. 하지만 엄마처럼 따뜻한 아주머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맛도 다르게 느껴졌던 거지. 접객이란 바로 그런 거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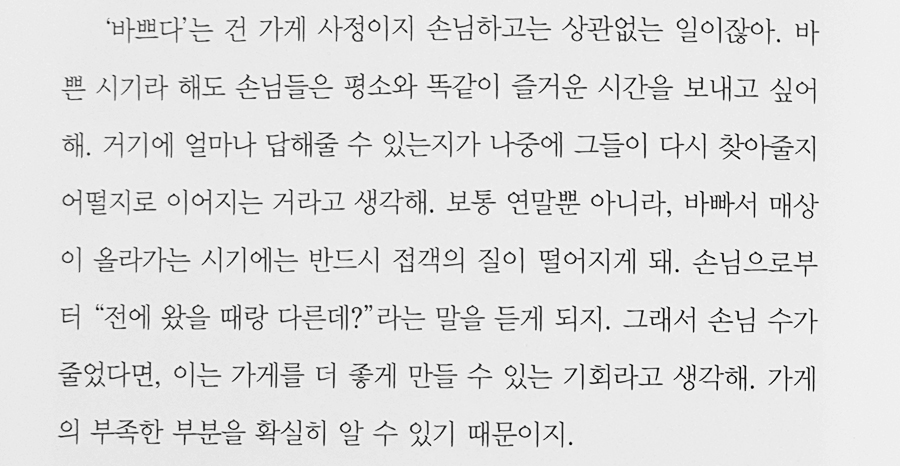
'바쁘다’는 건 가게 사정이지 손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
바쁜 시기라 해도 손님들은 평소와 똑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해.
난 책에서 강조했던 '한 번 온 손님은 다시 오게 만들자'에 무척 동의하는 게, 판매하는 쪽에서는 그것이 자신들의 매일매일 수 있지만 손님에게는 처음일 수 있다. 그런데 그 첫인상이 안 좋았다면? 다시 안 가게 될 게 뻔하다.
맛도 그렇다. 아이의 체인점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맛이라도 서비스나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종종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중요한 사실을 잊는 것 같다.
절대 과한 친절이나 서비스를 바라는 게 아님에도 이를테면 사소한 인사 같은 것도 잊으면서 장사하는 가게를 보면 손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걸까?
식당도 단골이 아닌 이상 한번 먹어보자 같은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는 그것이 처음 겪는 맛이고 서비스고 경험일 수 있다. 또한 책의 내용에 빗대봐도 모든 요리는 집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식당을 갈 때는 즐기고 싶다는 기분으로 갈 때가 많다. 가격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집에서 해 먹는 게 더 저렴한데 왜 굳이 식당을 갈까?
따라서 손님에게는 그 '기분'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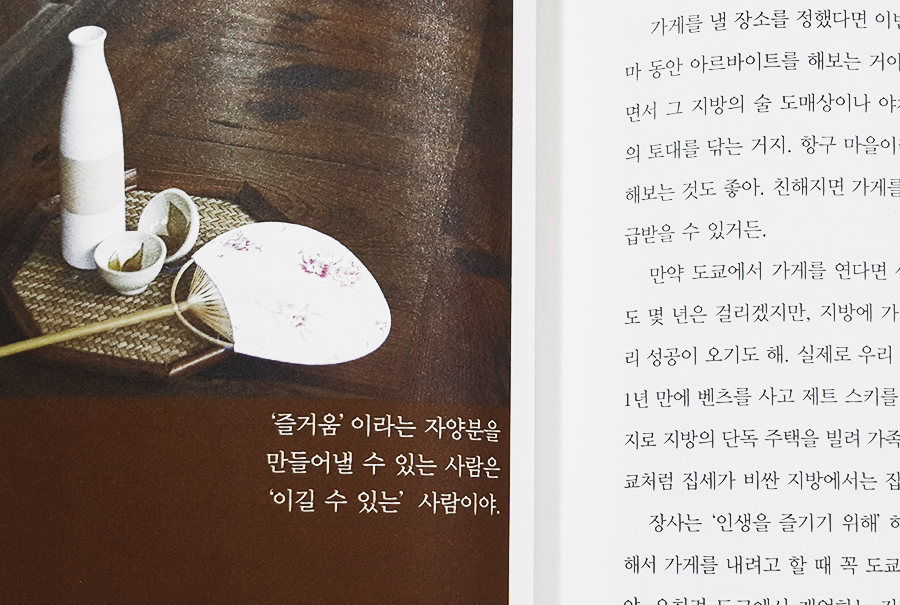
물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책의 내용을 보고 소위 말해 이렇게 다 후하게 퍼주면 장사는 뭘 남겨먹라는 거야? 하며 난색을 표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때로 과한 서비스도 서비스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접객이라는 것은 하는 쪽도, 받는 쪽도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내가 먼저 대접하면 손님도 다시 올 것이라 믿는 것이고 설령 그 믿음에 배신 당할지라도 장사의 먼 미래의 생각한다면, 또는 그 순간 그렇게 했던 자신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손해볼 일은 아닌 거 아닐까. 과한 친절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도 뒤에서 친절한 가게를 욕하는 손님은 없다.

어쨌든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손님을 생각하며 즐겁게 일해라는 것이고 현재 자신이 요식업, 장사,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결국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팔아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배우기에 나쁘지 않은 책이었다.
그리고 누구나 여러 가지 사고 사용해보면 알겠지만 재방문, 재소비 이거 정말 중요하다. 또한 누구나 손님을 생각하는 친절한 곳에 가고 싶지 불친절한 곳에 가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먹고 마시려는 사람도 넘쳐나지만 가게도 넘쳐는데 굳이 그런 곳에 왜...?
생각해보면 잘 되는 곳은다 이유가 있다.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그리고 행복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0) | 2022.10.24 |
|---|---|
| 마케터의 일 (0) | 2022.10.21 |
| 진짜 기본 강아지 육아 304 (0) | 2022.09.30 |
| 부의 추월차선 (0) | 2022.09.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