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한의 이웃, 허지웅
김영사 출판
한 나라, 한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글이었고, 처음 봤을 때는 책 제목인 최소한의 이웃이라는 말이 언뜻 이해가 안 됐는데 후에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감히 요약해 말하면 이웃에 관한 글이고, 책 소개에 따르면 "'최소한의 이웃'은 이웃을 향한 분노와 불신을 거두고 나 또한 최소한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분투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이 이 책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지 않나 싶다.
또는 작가의 글처럼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책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이 거창한 게 아닐 겁니다.
꼭 친구가 되어야 할 필요도 없고 같은 편이나 가족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이해받고 싶은 만큼 남을 이해하는 태도,
그게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의 전모가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보다는 작가의 새로운 책이라 때문에 읽게 된 경향이 컸는데 경어체 탓인지, 그 내용 탓인지 예전에 읽어봤던 작가의 책보다 훨씬 유해진 느낌이라 그게 좋았다. 물론 글도 좋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읽는 동안 신을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 구절에서 볼 법한 이웃을 사랑해라, 죄 짓지 않은 자만 돌을 던져라 같은 말이 내내 떠오르기만 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됐다.
왜냐하면 결국 그 이웃이 누구이든 이러한 내용에는 공감할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누리는 자에 의해 터지고 희생하는 자에 의해 수습되고, 다시 누리는 자에 의해 터지고 희생하는 자에 의해 수습되는 게 반복되며 배려와 희생의 시간이 영겁처럼 길어지고 있습니다.

책이 사라지는 건 정부가 금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편한 내용의 책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몰려가 항의하고 불편한 페이지를 찢는 게 공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 모든 과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면 논쟁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면 사람이 사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태우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편한 사람도, 항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점의 불편함도 찾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진 예능과 드라마를 온종일 보는 '화씨 451'의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들 훌륭한 분들이겠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도 모를 계획이니까 더 그렇지.
그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방관하고 굳이 할 이유가 없는 일을 탐구하며 사적인 이익이 되는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쓸데없이 이웃을 도왔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오해를 사리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악하게 태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나로서는 (그도 그럴 것이 아기가 어떻게 악하다고 태어난다고 믿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선과 이타심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렇게 선하다고 믿는 자신은 악하지 않을까? 항상 자신만 피해자일까?
나는 어느 쪽도 아닐 거라고 여기는데 살아보면 그게 그른 것처럼 보여도 알고 보면 아닌 경우도 많았고, 그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알고 보면 그른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책의 맥가이버 아저씨처럼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노력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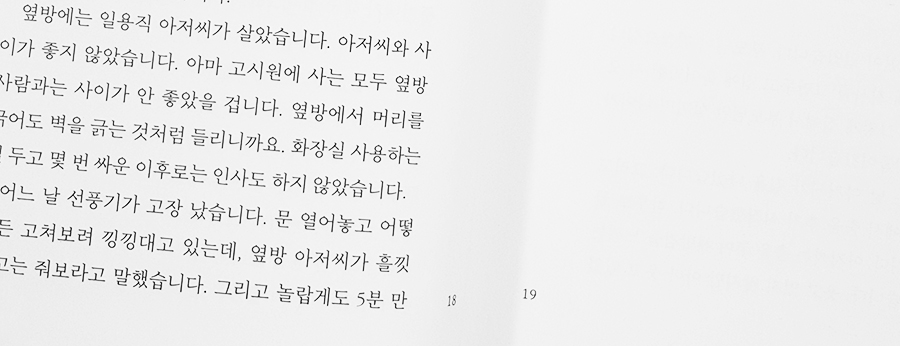
"옆방에는 일용직 아저씨가 살았습니다. 아저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선풍기가 고장 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5분 만에 고쳐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저씨는 고치지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애초에 대화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맥가이버 아저씨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심적으로도 '알고 보면 저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편하다.
허나 세상에는 분명 정말 잘못된 일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쩐지 사람은 평생 반성만 하네... 같은 씁쓸한 마음도 든다.
사람은 어디까지 사람을 옹호해줘야 하는 걸까. 또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의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어느 정도의 그 선은 알지만, 비판 받아 마땅하면 비판해도 되는 걸까.
사람이 문제일까, 그런 사람을 만든 사회가 문제일까.
생각할수록 복잡다단해지기만 하다.

당장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괴로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이 옳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덕분에 훗날 평안할 겁니다.
그래도 보통의 사람들은 책의 '그 결정 덕분에 훗날 평안할 거다'라는 말처럼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잘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자의적으로 생각하면서, 사회와 이웃에 관해 생각해보기에 좋았던 책이었다.


그리고 그 쓰러진 나무는 소리가 날 것 같다.
아무도 못 보았다고 해서 그곳에 있던 사람이 없던 사람이 되는 일은 아닌 것처럼.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와 고양이와 쥐 (0) | 2022.11.12 |
|---|---|
| 그까짓 고양이, 그래도 고양이 (0) | 2022.11.11 |
| 혼자서 종이우산을 쓰고 가다 (0) | 2022.10.29 |
| 그리고 행복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0) | 2022.1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