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게 다 외로워서 그래, 오마르
놀 출판
'오마르의 삶'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오마르의 세 번째 에세이다.
책은 두 권 다 읽어본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책은 책 자체가 컴팩트하고 예쁘게 만들어져서 좋았다.
제법 이름 있는 출판사가 만들어서 그랬을까.
그런데 대개 책이 팬시 같이 예쁘게 만들어지면 그 내용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책 자체도, 내용도 적당하고 읽기 편해서 좋았다.
주된 글은 사람 또는 사람과의 이야기를 풀어낸 글이었고 대략 책에서 좋았던 글은 이러했다.
작년 7월, 이사를 한 직후 테라스에 마련된 작은 텃밭에 이것저것을 심었다. 상추, 깻잎, 민트, 로즈메리 등.
날이 추워진 이후로는 테라스에 나갈 일이 거의 없었다. 제법 따뜻해진 3월, 봄맞이로 빤 이불을 널러 나갔다가 그때까지 살아 있는 식물들을 만났다. 겨우내 물 한번 제대로 준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거기 가만히 살아 있었다. 조금 힘없이 웅크리고 있지만 초록 빛깔은 잃지 않은 채로. 약간 뭉클한 지경이었다.
그날 난 정말이지 절절한 마음으로 그 식물들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가. 누가 봐주건 말건 나로서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그뿐인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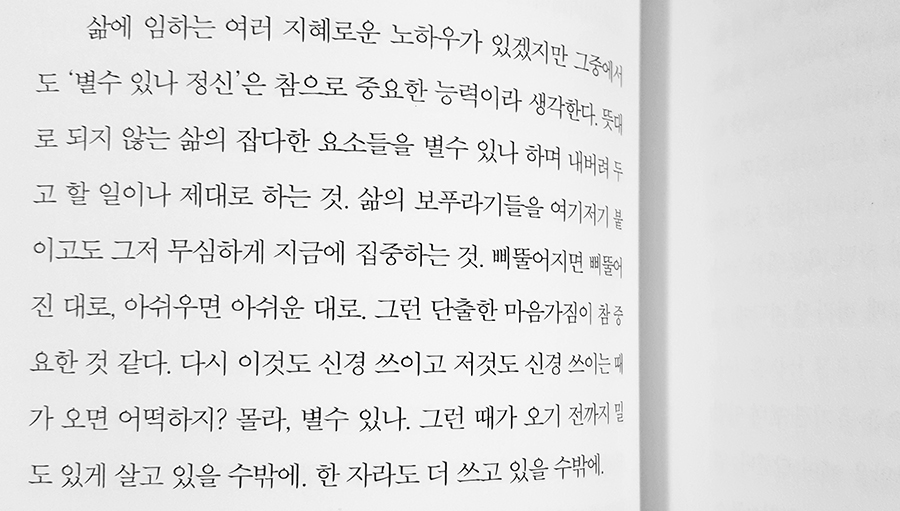
분명 똑바로 앉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진사는 거듭 오른쪽 어깨를 내리라고 했다.
이후 며칠간 신경이 쓰였다.
유심히 거울을 본다. 뻔히 놓여 있던 이목구비인데 새삼 발견하며 놀란다. 어깨 하나가 뭐 어쨌다는 건가. 눈, 코, 입, 귀, 눈썹, 광대뼈, 턱선, 치아, 콧구멍까지 모조리 좌우 위아래 전방위적으로 불균형한데. 그러고는 다시 삐뚤빼뚤 생긴 채로 살아간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아니라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지.
삶은 늘 어수선하다. 좀체 가지런한 법이 없다. 눈, 코, 입도 가구 배치도 인간관계도 모든 게 어쩔 수 없이 난잡하다. 알고 있는데도 한번 생각이 꽂히면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신경 쓰여 도무지 진짜 중요한 일에는 집중이 안 되는 것이다.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잡다한 요소들을 별수 있나 하며 내버려두고 할 일이나 제대로 하는 것. 삶의 보푸라기들을 여기저기 붙이고도 그저 무심하게 지금에 집중하는 것.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대로,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그런 단출한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사랑이 많은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당할 수가 없다.
고난이 없는 여정이란 없겠지만 모두에게 바람이 똑같이 불지는 않는다.
수통 없이 사막을, 우산 없이 빗속을 걷는 친구들을 생각한다.
출발점에서 받아야 했던 물품들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구멍 난 신발로 세상 위를 걷는 친구들을 생각한다.
막상 살아봤더니 사랑이란,
"오늘은 늦게 오셨네요?"
평소 아무 말도 없던 주차 관리원 아저씨가 어느 날 건넨 너스레에 있는 것이었다.
"오늘은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겠다!"
아직은 뜻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말은 감동적이다. 뜻도 모르는 그 피곤한 여정을 아무튼 이제 너랑 '해' 보겠다는 그 각오만은 선명하니까.
책 제목도 외로움이고, 책 앞장에도 적혀 있고, 뒤에서 작가는 외로움에 관해 적기도 했는데 외롭다는 건 뭘까.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던 것도,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의미를 건지려 했던 것도, 이 자리 저 자리 기웃거리며 술잔을 기울였던 것도 끝에 가면 다 외로워서다.
당신도 어딘가에서 외로울 거라 생각하면 마음이 놓인다. 타인이 힘든 걸 위안 삼으면 안 된다고들 하는데, 나는 여태 살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보다 확실한 위로를 발견한 일이 없다.
모두가 여기서 함께 외롭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의 마음도 괜찮았으면 좋겠다."


외롭다는 것은 관념일까, 진실일까.
게다가 요즘같이 스마트폰에 둘러싸여 생활하는 것이 모두의 일상인데 외로울 틈이나 있을까.
아니면 결국 외로우니까 TV든, SNS든,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사람이 나오는 것을 봐야만 하는 걸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과는 멀어지기도 한다는 것이 좀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상황.
그 모두 그저 즐긴다의 개념만 있을 뿐, 자신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서.
그런데 왜 또 가까워지면 피곤해질까. 그래서 끝내 헤어지고 마는 존재가 되는 걸까.
그런 이유로 가만히 묵묵히 자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풀떼기'가 진정 위대한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외로운지, 안 외로운지조차도 모르겠다.
읽으면서 결국 사람이 자산이다 같은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사람한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긴 한 걸까.
어쨌든 작가가 적었듯이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알면 마음이 놓인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약간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외로움이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덜어졌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매일을 헤엄치는 법 (0) | 2023.01.04 |
|---|---|
| 마케터의 글쓰기 (0) | 2022.12.31 |
| 내 남편은 아스퍼거 1 (0) | 2022.12.25 |
| 강신주의 다상담 3 (0) | 2022.1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