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화학으로 세상을 읽는다, 크리스 우드포드
반니 출판
Atoms Under the Floorboards
과학은 세상과 우리 주변을 이루는 기본 바탕이지만 관점에 따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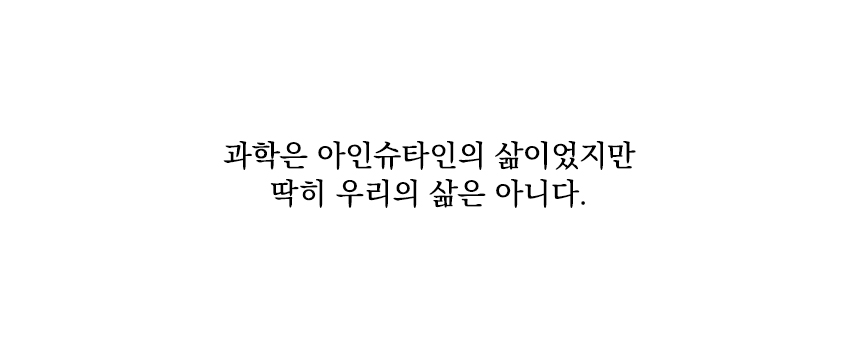
"과학은 아인슈타인의 삶이었지만 딱히 우리의 삶은 아니다.
우리는 과학에 대한 생각을 1초도 하지 않고 수십 년을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과학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단 1ns(나노초)도 살아남을 수 없다.
와이파이 인터넷부터 단열 창문까지, 뇌 스캔부터 시험관 아기까지, 과학은 현대의 삶을 구성하는 기술을 쏟아내지만 여전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
그리고 우리 중 70%가 신문과 TV가 과학을 과장한다고 생각하면서도 86%가 그 믿지 못할 미디어에서 정보를 얻는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 집 주변의 과학을 다룬다는 작가의 말처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을 쉽게 설명해 사물의 원리를 일깨워 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책의 내용은 원자, 금속, 유리, 부식, 배터리, 물, 디지털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만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것은 원자와 디지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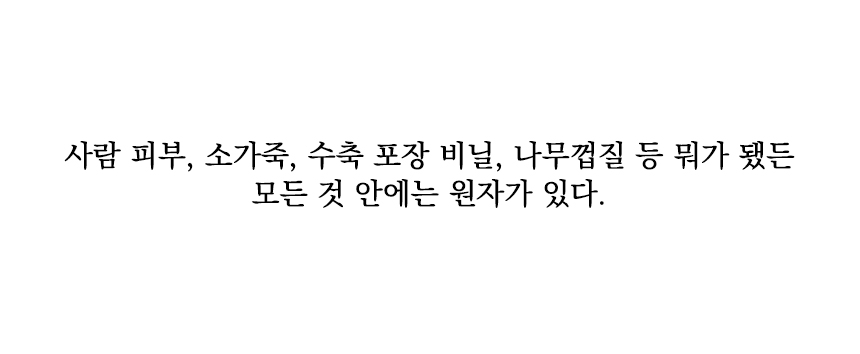
"피부 아래는 다 똑같다."
로자 파크스와 마틴 루터 킹 같은 미국 시민권 운동의 영웅들에게 영감을 준 진리다. 하지만 사회정의 교리인 동시에 과학적 사실이기도 하다. 이는 인간의 평등사상을 대변하는 것을 뛰어넘어 지구상 모든 것에 낱낱이 적용된다.
사람 피부, 소가죽, 수축 포장 비닐, 나무껍질 등 뭐가 됐든 모든 것 안에는 원자가 있다. 그리고 원자에 대한 이해 없이는 물질에 대한 이해도 없다.
유리는 지구상의 어느 것보다 맑고 투명하다. 우리는 유리를 보면서 공백을 생각하고 따라서 가벼울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유리를 액체로 생각하든 고체로 생각하든 또는 그 사이에서 길 잃은 영혼으로 생각하든, 그것은 비어 있지 않다. 셀 수 없이 많은 원자로 가득하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거기 엄연히 존재한다.
풍선을 둥실둥실 뜨게 해주는 헬륨가스 같은 가벼운 것들은 가볍고 단순한 원자로 이루어진 반면 핵연료로 쓰는 우라늄처럼 무거운 것들은 복잡하고 크고 묵직한 원자들로 꽉꽉 차 있다.

얼음덩어리는 콜라 컵 안에서 경쾌하게 댕그랑대고, 양동이의 물은 수평으로 뿌려져서 바닥을 가로질러 날아가다가 벽에 맞고, 수증기는 끓는 냄비에서 자욱이 올라와 금세 주방에 퍼진다.
다락에 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생활이지만 마룻장 밑에 원자가 있다고 믿는 것은 과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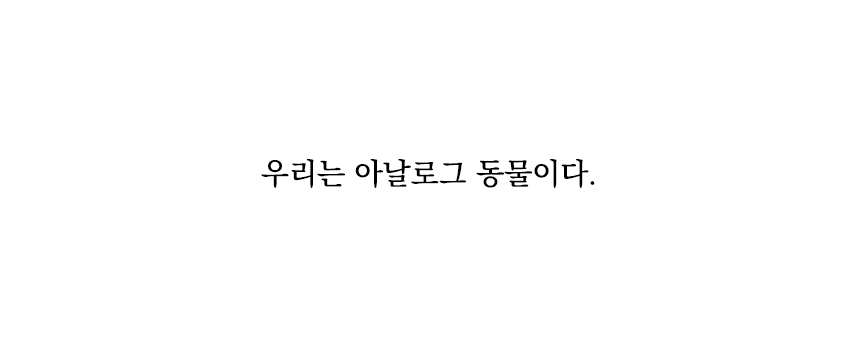
우리는 아날로그 동물이다. 우리는 소리를 듣고, 그림을 보고, 감정을 느낀다.
이 중 무엇도 말로 바꾸기 쉽지 않고, 숫자로 표현하기란 더더구나 어렵다.

반면 컴퓨터는 자기가 씹어 먹는 숫자에서 어떠한 의미도 찾지 않는다.
컴퓨터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붓놀림을 의미하는 수 배열과 롤링스톤스의 노래를 담은 수 배열에 어떤 구분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절반에 불과하고, 그나마 더 나은 절반에 해당한다. 진짜 문제는 컴퓨터가 몰상식하다는 것이다.
인간 세계의 가장 심오한 의미도 컴퓨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컴퓨터의 이진법 사고방식에서는 연예인의 트윗과 《쿠란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지금은 집에서 고전영화를 보고, 신간 소설을 다운로드받고, 홍콩에 있는 여동생과 화상채팅을 하고, 삼시세끼를 배달음식으로 해결하고, 이메일로 업무를 본다. 이 모든 것을 집안을 벗어나지 않고서도, 심지어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인터넷은 아니다. 컴퓨터도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다. 현대 세계는 매우 단순한, 하지만 무시무시하게 강력한 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아날로그 시대에 비하면 확실히 정보는 쉽게 생성되고 쉽게 버려지는 일회성 소모품이 됐다.
우리는 지금도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 하지만 이메일, 문자, 트윗을 날리기 전에 우리가 과연 뇌를 쓴다고 할 수 있을까?
21세기의 방대한 온라인 쌍방향 잡담 기록이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만큼이나 빨리 무위로 사라진다 해도 누구 하나 섭섭해하기는 할까?

숫자로 그리는 그림이 예술의 의미 있는 반영이 될 수 없듯, 숫자로 적히는 삶도 실생활의 진정한 반영은 아닐지 모른다.
그 외 플라스틱이 썩지 않는 이유에 관해 단지 물질로서 플라스틱이 썩지 않는다고 여기기 쉽지만, 책에서는 그것을 분해해 줄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니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지극히 먹성 좋은 (식성도 특이한) 극소수의 박테리아를 제외하면, 지구의 어느 생명체도 플라스틱을 먹거나 소화시키는 방법을 익히지 못했다.
플라스틱이 천연물질보다 환경에 오래 남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것이 얼마나 오래 썩지 않고 쌓여 있느냐다. 답은 무려 수백 년이다.
물질의 지속성은 햇빛, 물, 열, 박테리아 같은 자연물들이 얼마나 쉽게 내부구조를 분해해서 보다 무해한 것으로 되돌려놓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짜증나는 일이지만 사실 광퇴화는 플라스틱을 환경에서 분해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광퇴화 같은 자연 효과의 도움이 없으면 플라스틱은 영원이 우리 주위에 뭉개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가장 심오한 사실은 컴퓨터가 아날로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디지털로만 일을 처리하는 것만큼 과학을 좋아하느냐, 문학을 좋아하느냐의 차이 같은 것 또한 원자와 숫자, 또는 우주 등과 하등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인간은 그런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는 걸까.
왜 누군가에게 과학은 의미 있는 것이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 '과학'을 밝혀온 것일까.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사람이 가장 신비롭기까지 하다.
아무튼 일부 책의 글을 살펴봐도 복잡하지 않으므로 과학에 관심이 있다면 읽어보길 추천하다.
그러고 보면 출판된 지 좀 오래된 책이라 찾아보면 이보다 좋은 책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물의 원리를 알기에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잘잘 (0) | 2023.11.14 |
|---|---|
| 모든 멋진 일에는 두려움이 따른다 (0) | 2023.11.04 |
| 커피의 위로 (0) | 2023.10.14 |
| 어휘 늘리는 법 (0) | 2023.10.08 |



